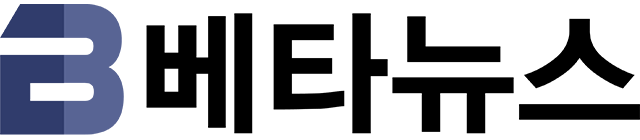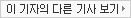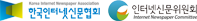입력 : 2011-07-17 21:52:20
베타뉴스 독자 여러분, G드라이브를 알고 있는가? 과거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드롭박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2006년 3월 애널리스트 배포자료에 처음 언급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G드라이브는 '무한 용량'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7월 어느 날, 구글과 안드로이드 서비스에 관심 많은 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구글+' 테스트 서비스 사용을 시작했다. 구글+의 성공여부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논의는 없지만 무언가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느끼게 함은 충분하다.
|
= 구글+, 페이스북의 아류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구글+를 접하면서 놀란 것은 갤럭시 탭으로 촬영한 사진이 어느새 구글+로 업로드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앱 환경에서 구글+를 사용하면 마치 스마트 폰이 Eye-Fi(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무선 랜 지원 SD카드)가 달린 디지털 기기가 된 듯하다.
예를 들면, 즐겨 찾는 음식점에서 '해물짬뽕' 요리 사진을 갤럭시 탭으로 촬영했다고 하자. 그러면 별다른 조작 없이 구글+의 '사진'(피카사)에 등록되는 것이다. PC에서 e북을 구입하면 곧바로 킨들에 책이 다운로드되는 아마존의 '위스퍼넷' 같은 느낌이랄까.
안드로이드는 '구글+ 생태계의 일부'이다. 게다가 구글+는 2048×2048 이하의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진'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글+'는 피카사의 소셜화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서클에 포함된 친구들의 사진을 '사진' 메뉴로 정리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체험이다.
이 '사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 페이스북이야말로 사진으로 성공한 웹 기업이 아닐까? 페이스북은 사명처럼 '사용자 얼굴 사진'을 최대 가치로 시작했으니 말이다. '얼굴'이 있기에 일상의 얽힌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관심을 표하기 위한 판단의 재료가 된다. '얼굴'이라는 가장 커다란 '표현 매체'를 사용한 것은 페이스북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 구글+ '사진'의 손쉬운 사용은 꽤나 영리한 전략인 셈이다. 지금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은 사람들의 '오감'을 이용한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클라우드형 음악 서비스로 격렬한 싸움을 치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내 비디오 사용량 증가로 비디오 채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영역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스카이프)와 패이스북이 경쟁한다.
서두에서 'G드라이브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한 것은 구글+가, 무한에 가까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더해 사람들의 오감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오간다면 즉, 모두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싶은 데이터가 우리 모두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가지고 싶은 정보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면, 곧 무한의 용량을 가진 스토리지와 같지 않을까.
클라우드 기반의 SNS와 협업도구의 접목
일부 사람들은, 구글+를 '페이스북의 표절'이라고 말한다. 사실, 구글 관계자도 페이스북의 '친구'라는 구조가 좋은 개념이 아니기에 '서클'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테스트 서비스가 시작되고 1주일 정도 지나면서 구글+는 '트위터의 진화형'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 구글+의 주요 기능. 정보 공유가 쉬운 서클, 정보 검색이 뛰어난 스파크, 비디오 채팅의 수다방. 구글 독스와 연개한 협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구글이 트위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워터를 인수하러 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다. 2007년, 당시 '텀블러'와 함께 트위터 라이벌로 주목 받았던 '자이쿠'를 인수, 구글 버즈라는 서비스를 내놨다. 물론 실패로 끝났다.
구글이 트위터에 대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껏 구글이 수집한 웹이나 메일 등의 데이터는 누군가가 읽는다는 것을 상정하는 콘텐츠다. 반면 트위터는 말 그대로 재잘대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데이터이기 때문. 즉, 사람들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게다가 실시간이다.
여기까지 검색할 수 있다면 '온 세상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구글의 목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게다. 그러나 구글+가 이러한 목적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구글의 일거수일투족은 애널리스트나 저널리스트들의 잔소리 대상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념이나 전략에 기초를 두고 그려진 시나리오인가에서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 가까운 것은 페이스북이 아닐까 한다. 페이스북은 다양한 타사 서비스의 엣센스를 흡수하면서 성장한 증축 건축물과도 같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글의 목적 이상으로 강력한 비전이 있는데도 말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세계가 더욱 더 투명한 방향으로 흘려가는 것은 다음의 10년, 20년 이후 일어나는 변혁의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말로 자신들이 인터넷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것을 위해 '실명제'나 그 이상으로 관계가 '사실'임을 페이스북은 고집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페이스북은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프로필'을 만들려 하는 것으로 필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성을 나두다 보면 '투명성'이 다소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반면, 구글+의 서클은 애매모호하다. 구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이 만든 서클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니PC 좋아'라는 서클을 만들고 마음대로 정보를 공유하고픈 사람을 포함시킨다. 어디까지나 이용자를 위한 '클러스터 식별 태그'가 서클이다. 예컨대 프로그래밍은 천재적이지만 어딘가 느슨한 게 구글+이며 그래서 호흡하기 쉽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서클이나 비디오 채팅을 잘 사용하면 그룹웨어적인 협업 도구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피카사의 소셜화'일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구글 독스 등 구글의 기존 서비스를 소셜 기반에서 사용하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SNS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구글이 클라우드형 SNS와 협업 도구를 결합한 '구글+'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확실한 입지를 구축할지 아니면 페이스북 아류작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지 사뭇 궁금하다.
베타뉴스 이상우 (oowoo73@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목록
목록-
 위로
위로